그때 뵈었던 대웅전 부처님은 잘 계시는지
사람들은 나를 밝고 웃음이 많은 외향적인 사람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의 나는 정반대다. 이런 민낯을 감추려 애쓰며 내 모습과는 정반대의 가면을 쓰고 지냈다. 사회생활을 거듭할수록 가면은 단단해졌지만, 가면 속 나는 약해지는 느낌이랄까. 응어리들은 결국 깊은 불면증이 되었고, 나를 괴롭히는 시간도 많았다.
그때는 이 힘듦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 이제는 템플스테이가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절이 주는 포근함과 편안함.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에 잔잔한 안정감과 위안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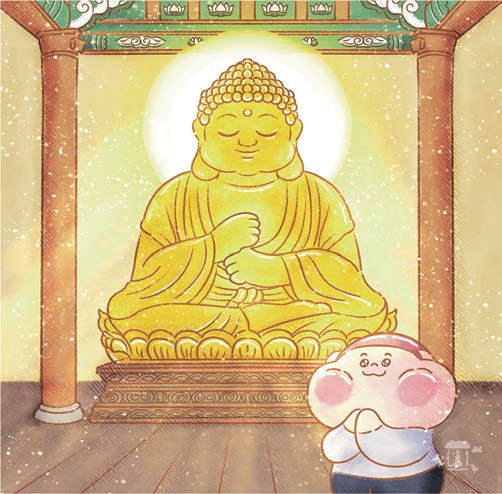
하나씩 꺼내보면서 내일을 버티게 한 힘
7년 전 4월. 11년간의 일에 지쳐 번아웃이 온 나는 모든 것을 멈췄다. 꾹꾹 눌러 담았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정리한 때였다. 이때다 싶어 이 땅의 가장 먼 곳, 남녘 끝으로 여행계획을 세웠다. 지금도 처음 떠났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다.유난히 따뜻했던 남쪽의 온기. 온갖 꽃가루와 황사가 뒤섞인 4월 봄바람마저도 그저 상쾌하게만 느껴졌으니, 그때의 풋풋함이 지금도 며칠 전 일만 같다. 온 천지가 봄을 향해 달려가는 듯했고, 산 빛깔만 봐도 연두와 초록 사이에 열 가지 색쯤은 더 구분할 수 있었다.
산천초목이 푸른 빛을 내뿜고 간간이 분홍과 노랑으로 고명을 얹어주는 계절, 봄이었다.
첫 템플스테이는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다. ‘절에서의 시간이 너무 정적이고 단조롭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특히 절에 가면 항상 발우공양을 해야 할 것만 같고, 딱딱하고 엄격하기만 할 것 같았다. ‘마치 군대 같은 분위기이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도 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웬걸, 막상 가보니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라 깜짝 놀랐다.
지금도 가끔 첫 저녁예불이 떠오른다. 삼배가 뭔지 알 리도 만무하고, 예불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 갓 입대한 이등병처럼 잔뜩 긴장해서 두 손만 공손히 모은 채로 법당에서 뚝딱거렸던 내 모습이. 그래도 나름 처음인 걸 티 내지 않고 싶은 마음에, 옆에 계신 분을 보며 어설프게 따라 했었다. 곁눈질로는 부족해서 고개를 반쯤 돌려가며 얼마나 열심히 따라 하던 때인가.
얼마나 풋풋한 기억인지 모른다. 이제 템플스테이 8년 차인 나는 칠정례와 『반야심경』을 보지 않고도 꽤 잘 따라 하고 있다. 어느 누가 봐도 신심이 꽤 있어 보이는 불자처럼 말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템플스테이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았냐고 물으면 한 가지만 고를 수는 없다. 일주문을 지나 봄에 휘감긴 절을 마주한 첫 만남. 졸졸 흐르는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계절마다 다른 바람의 온도. 처마 끝의 풍경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저녁예불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오솔길을 걸었던 시간들. 겨울 끝자락에 내린 폭설에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흙길을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살살 걷던 내 모습까지도 모두 좋았다.
버스에서 내려 1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를 걸어야 나오는 절에 고생스레 걸어 올라가던 날,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시는 스님과 보살님들의 미소에 피로가 사라지던 경험도 있다.
때로는 나를 맞이해 주시는 분들의 모습과 말씀들이 흡사 대웅전 부처님 같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온화한 표정,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는 눈빛, 그리고 여기까지 너무 잘 왔다고 조용히 다독거려주시는 것까지. 새벽 6시에 받은 수라상 같던 아침 공양에 신났던 기억도 있다. 그 모든 아름다웠던 장면들을 가슴속에 차곡차곡 잘 담아두었다가 하나씩 꺼내보면서 내일을 버티는 힘으로 삼았다.
계절이 바뀌면 절이 그립다
템플스테이에 가면 저녁예불과 새벽예불엔 꼭 참석한다. 새벽예불은 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르면 새벽 4시쯤 시작하는 곳이 있다. 그럴 땐 4시 전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준비하고 나가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절이 아니라면 깨어있지 못하는 시간. 새벽예불은 나와의 약속이며 절에 왔으면 응당 부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별이 보이는 캄캄한 밤, 주섬주섬 옷을 챙겨입고 방문을 열고 나올 때 코끝에 느껴지는 찬 공기, 도량석 목탁 소리만 울리는 적막함. 세상 모두 경건하고 마음도 가지런해지는 기분. 새벽은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시간이다.
삼 배를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기다린다. 깊은 산속에서, 정돈되지 않은 나의 새벽 첫 목소리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면 마치 우주에 혼자인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그동안 어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도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이다. 이 느낌 때문에 내가 어쩌면 기를 쓰고 일어나 참석하는지도 모른다. 예불을 마치고 나오면 엄청난 성취감과 만족감이 든다. 평소에는 자신에게 인색하던 나이지만 이때만큼은 정말로 스스로에게 큰 칭찬을 해 준다.
새벽예불만큼이나 아끼는 시간은 스님과의 차담이다. 처음에는 순수한 궁금증으로 참석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님이 주시는 깊은 차 맛에 반했다. 이제는 차담이라고 하면 즐거운 마음이 먼저 든다.
차를 따르며 스님께서는 근황을 물으신다. 요즘 사는 건 어떤지, 근심과 고민에 대해서 말이다. 솔직히 나는 그 숱한 차담 동안 한 번도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 놓지는 못했다. 쉽게 입이 안 떨어졌달까. 그런데 입만 꾹 다문 채 다른 이의 인생 고민, 자식 걱정 등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듣던 어느 날, 스님께서 다른 분을 향해 해 주던 대답에 크게 위로받은 적이 있었다. 오묘하고 신기한 기분이었다.
나는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속앓이를 하는 편이었다. 그런 나에게 템플스테이는 ‘내려놓음’을 가르쳐 주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를 익혔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배웠다.
어느 날, 템플스테이 방에 앉아 창호지를 바른 나무 창살 문을 가만히 바라보다 동그란 쇠 손잡이에서 묘한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낀 기억이 떠오른다. 템플스테이만큼 편견 없고, 강요하지 않고, 묵묵히 본인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드물다. 혹시 망설이는 이가 있다면 말하고 싶다. 짐을 가볍게 챙겨서 일단 떠나보라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면 그때 뵈었던 대웅전의 부처님은 잘 계시는지, 아름드리 느티나무는 여전한지 깊은 궁금증이 일어난다. 그러면 홀린 것처럼 짐을 싸서 절로 향한다. 8년 동안 템플스테이를 다녔지만, 여전히 가보지 못한 절이 많다. 나는 그 고요한 길 위에서 나를 찾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