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
글. 혜해 스님 그림. 봉현
나는 다시 길 위로 가요. 이게 나의 일인 걸요.
Take my place out on the road again, I must do what I must do,
비록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언제나 당신을 생각할 겁니다.
A travelin' boy and only passing through, But one who'll always think of you.
- Art Garfunkel, 「Traveling boy」 중에서

1.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면 출가하라는 소리를 듣곤 했다.
스님들은 출가하라는 농담에 진담을 섞어 내게 던지셨다.
내 어린 볼이 불그스름하니 스님들 보시기에는 마냥 순박해 보였겠지만,
나는 그때도 그다지 착한 편은 아니었다.
속으로는 저 대머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조금 더 자라자, 이제는 어머니까지 출가하라는 소리를 하셨다.
스님들 하시듯이 농담을 좀 섞어줬더라면,
나도 스님들에게 하듯이 코웃음이나 치고 말았을 텐데,
어머니의 말은 사뭇 진담 같았다.
그래서 더욱 지독하게 싫었다.
그런 내게 어느 날인가 어머니는 말했다.
네가 어디서 무얼 하든 정말로 자유롭기를 바란다고.
그때는 화낼 자신이 없었다.
자유.
왜냐하면 나도 그걸 바라고 있었으니까.
나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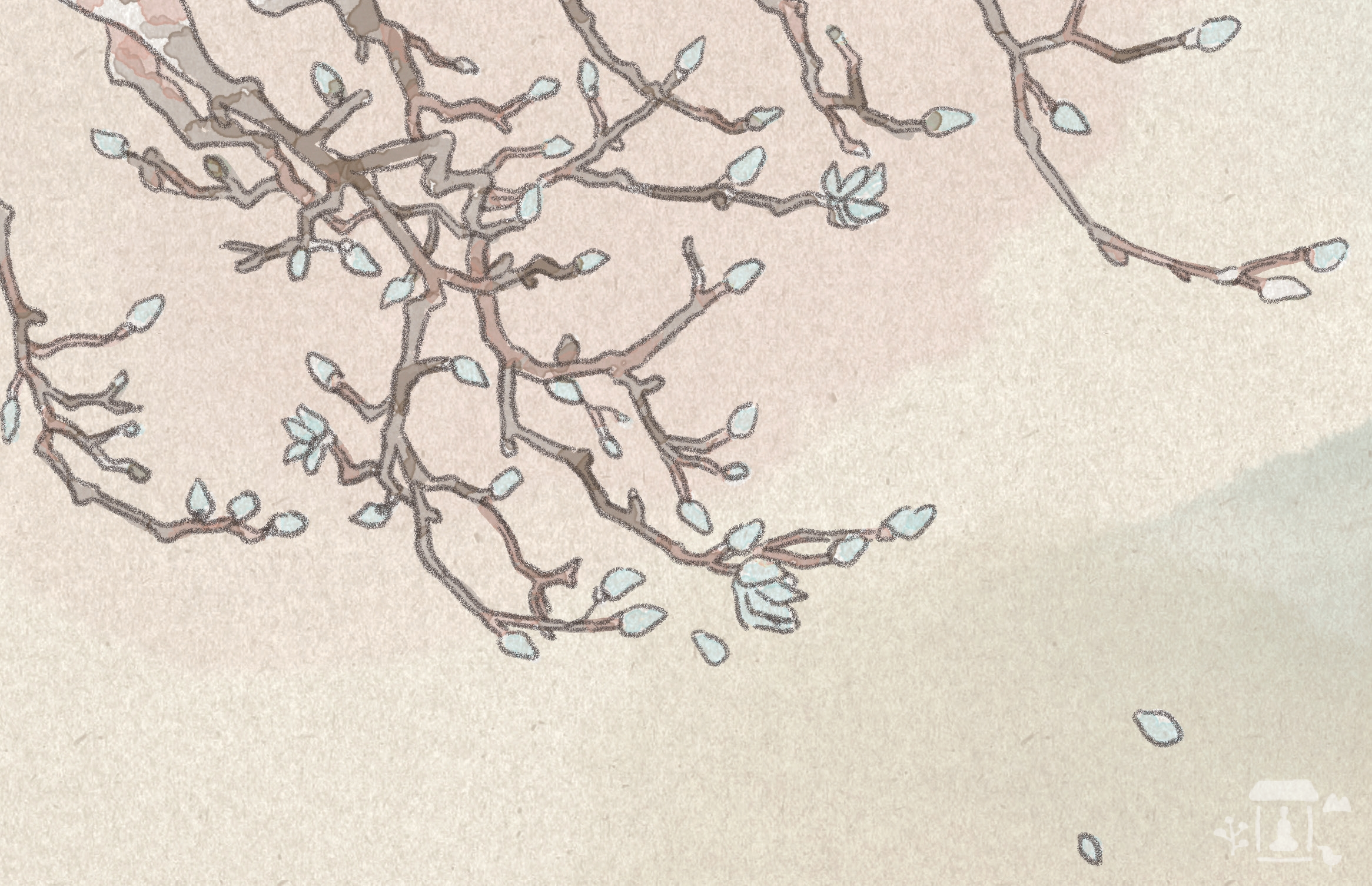
2.
차가 주택가로 들어선다. 언덕길. 전신주. 빌라와 낡은 양옥들.
아직은 얼어 있는 화분. 검은 고양이가 비닐봉지처럼 웅크려 앉은 풍경에 젖은 골목의 냄새가 풍긴다.
골목의 냄새는 왜 어디든 다 같을까. 시골이든 서울이든. 서로 어깨를 바짝 붙인 채 늘어선, 삶의 냄새.
골목 끝에 일주문이 보인다. 차는 나와 내 45리터짜리 배낭을 절 마당에 떨구고 언덕길을 도로 내려간다.
마당 한 편에 가느다란 목련나무가 한 그루 있다. 덜 핀 목련의 봉오리는 붓끝 같다.
이곳 서울 하늘은 그 붓이 제 먹을 찰방찰방 헹궈놓은 물빛처럼 묽은 회색이다.
어딘지 하숙집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도심의 선원. 이 봄에 내가 지낼 곳이다.
운수 행각이라고 하나. 운수 행각. 구름이나 물과 같이 떠돌아다닌다는 뜻이다.
안거마다 방방곡곡 처소를 옮겨 다니는 스님네들의 모습이다.
비구계를 받고 선방 첫 철을 쇠기 위해 인천에 갔던 여름,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타고 선원으로 가던 길목에서 느끼던 갈증과 흐르는 땀은 날씨 탓이었을까.
선원에 도착하곤 입구를 헤맸었고, 복도는 어두웠다.
배정된 방에 배낭을 던져두고 우두커니 서서 생각했다.
‘나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됐구나.’
출가를 갓 하고 행자실에 막 들어갔을 때도 꼭 그랬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공양간에 널린 숟가락보다도
내가 이 세계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사실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 사실이 건방진 나를 묵연하게 만들기도 했으므로 행자로서의 덕목을 갖추는 데 때로는 보탬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쓸쓸했다.
행자는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들 했다. 하지만 아끼고 말고 할 게 있었나.
가진 게 있어야 아끼지. 나는 조금씩 배웠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어리숙한 이방인인 나를 제외한 모두가 으레 공유하는 낱말과 관념, 행동과 태도, 관계와 규격을 알아가고 익히고, 소동 속에 스며들어 어느덧 묵연함을 떨친 채 자연스럽게 섞이기까지 한 계절쯤이 소요되었다.
새로운 내가 된 것이다. 아, 나를 찾은 것일까?
그러나 무르익은 계절이 비로소 집처럼 아늑히 아름다울 때, 계절은 더 깊어지지 않고 붕괴되었다.
익숙한 것들은 꽃가루처럼, 장맛비처럼, 낙엽처럼, 눈발처럼 흩어지고 쏟아져 내렸다.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리곤 다시 시작이었다.
종전의 판을 시간이 야멸차게 걷어가고, 막무가내 새 판을 벌이면
무엇도 알지 못한 채로 다시금 그냥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일.
출가한 뒤로는 줄곧 그렇게 반복되는 미지 속에 놓였다.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미지의 범위는 전방위적이다.
사람, 상황들, 화두,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비켜 갈 수 없었다.
알아가나, 알아챘다 싶을 때는 여지없이 아니라는 티를 내었다.
이대로 가면 다음일 줄 알았는데, 처음이었다. 원점이었다.
원점으로부터 펼쳐진 텅 빈 대지, 그 끝없는 미지는 자유일까. 고독일까.
그냥 그렇게 걸어갈 뿐이다.
문득 생각한다. 사실 어머니는 내게 출가를 권유한 것이 아니었다.
비단 출가가 아니더라도, 삶이 주는 필연적인 고통을 나에게만큼은 답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헤어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머니는 어떻게든 알리려 했을 것이다. 어느 무엇이라도 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출가는 자유를 담보하진 않았고, 삶의 냄새가 지워지는 법도 없었다.
머리를 퍼렇게 깎고, 새벽같이 일어나 종도 치고 북도 치고, 풀 반찬을 아무리 씹어대도 삶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선연했다.
삶으로부터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그 중심부로 더욱 비집고 들어가는 매일.
삶에서 벗어나지질 않고 지긋지긋한 삶의 표정을 종일토록 들여다봐야 하는 나날만이 선연했다.
그 안에 그대로 흠뻑 머물되, 다만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계절마다 또렷이 나고 죽으며. 움켜쥐었다 남김없이 놓으며.
어머니는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삶이 주는 고통에서 헤어나려면 삶이 주는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하여 삶이 주는 고통에서 헤어나기를 바라며 내게 출가를 권하셨을 것이고,
동시에 삶이 주는 고통을 직시할 내가 걱정되어, 나를 보낸 뒤에는 여러 날 밤잠을 설치며 우셨을 것이다.
나는 어느새 배낭에서 짐을 풀고 있다. 적응한 걸까. 아니, 여전히 막막하다.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었다. 떠나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조금은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삶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집,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없다는 것을.
운수 행각이란 절집 스님네들만이 전유하는 생활양식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삶의 모양, 예외 없는 구조라는 것을.
전 생애에 걸쳐 끝나지 않을 운수 행각의 예감을 느끼면서,
나는 낯선 방을 구석구석 닦는다.

혜해 스님 진화 스님을 은사로 2018년 사미계, 2023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송광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자기소개는 … 너무 어렵고 부끄럽다. 내가 만난 것들은 내가 되었나. 내가 만난 것들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끝내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까.
봉현 일러스트레이터 저서로 『베개는 필요 없어, 네가 있으니까』 『여백이』 『그럼에도 나는 아주, 예쁘게 웃었다』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