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기
여름. 점심에는 숲으로 간다. 산책길의 초입에서 인동덩굴의 향기가 난다. 하얀 향기의 유효거리는 서너 발걸음. 이후로는 온통 뒤엉킨 풀 내음, 자욱한 초록빛 소란만이 두텁다. 짧은 그 서너 발걸음 속에서, 문득 스친 인동덩굴의 향기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 하여도 찰나의 신선한 인동덩굴 향기를 멀리로는 전할 수 없고, 헤어져야 하는 사람들은 헤어진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볼 수 없다. 마음은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바 없이 매번 세련되지를 못하고, 그리움은 언제나 옛 방식으로 온다. 인동덩굴 향기 곁에 섞여 드는 방식으로. 공연히 먼 데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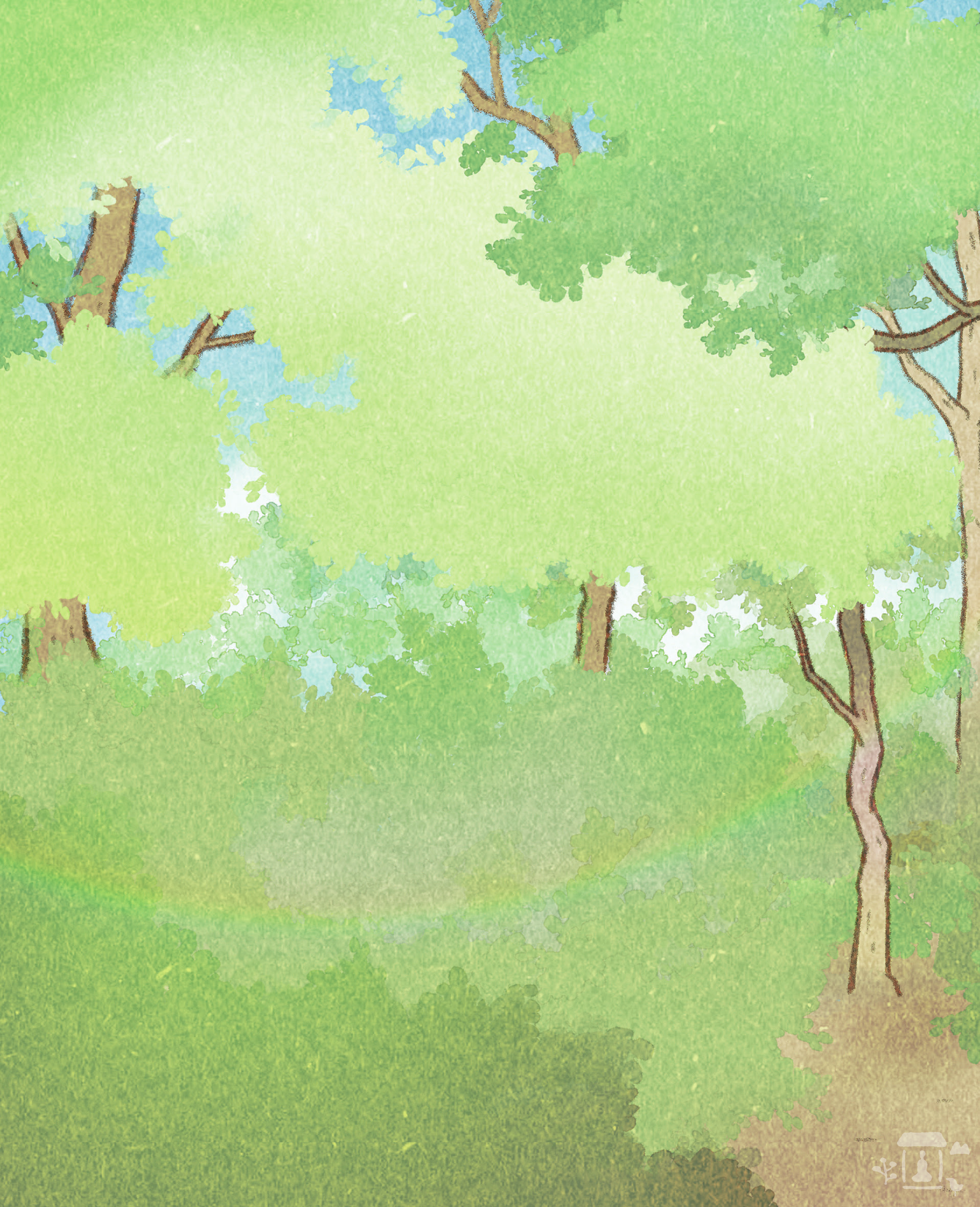

그를 처음 만난 것은 8년 전. 행자 때였다. 멀리서 귀한 스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객실에 봄 이불을 넣어두었다. 오후가 되자 전달받은 대로 한 스님이 절에 찾아왔다. 사미승에다가 나이는 나보다 어려 보였다. 그렇게까지 귀해 보이지는 않았고 멀리서 온 것 같기는 하였다. 방으로 모시자 청소할 걸레를 청하기에 두어 장을 내어드렸다. 저녁에는 그날 법당에서 내린 공양물 중 가장 그럴싸한 일제 양갱과 도라야끼를 골라 생수 몇 병과 함께 그 방 마루에 두었다. 밤에 삼경종을 치고 그 앞을 지나올 때 빈 마루를 보면서, 먹었구나 하였다. 벗어놓은 신이 가지런하였다.다음 날 아침에는 부슬비가 왔다. 관음전에 마지를 올리고 공양간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나.
나는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저쪽에서 바랑을 챙겨 맨 사미승이 관음전 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산을 내주었다. 정중하고 뜻 없는 인사를 주고받았던가. 내가 돌아보았을 때 그는 우산을 쓰고 관음전 계단을 자박자박 오르고 있었다. 그날. 그 유록색 물기들. 봄이구나. 낡은 관음전의 정경도 불현듯 새로웠다. 길었던 겨울을 싸안아 걷어가는 봄빛, 새것 같은 그 봄비에 투명하게 젖어가는 관음전 앞으로 단정한 성격의 어린 사미승이 지나고, 나는 염불 대신 이승훈의 노래를 마저 흥얼거리면서 공양간으로 돌아오던 날. 그날을 어쩐지 잊지 못한다. 얼마 후 봄이 익어 산철로 접어들 때 그 사미승은 우리 절 강원에 입방하였고, 나는 그해 여름에 행자 생활을 마친 뒤 가을에 그 사미승의 반에 편성되었다. 그로부터 그와 4년을 같이 살았다.
꼬박 4년을 같이 살았다. 서로를 싫어하며. 짧은 방학을 보내고 다시 강원으로 돌아갈 때면 그와 또 매일 붙어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풀 먹여 다린 것처럼 빳빳하게 얼어있던 갓난쟁이 초학 시절, 다리에 두른 행전 매듭처럼 꽉 조여진 생활 가운데서도 틈새마다 새어 나오는 반골 기질, 화, 추하게 조는 몰골과 쉬이 달래지질 않던 허기, 눈물, 허물, 그 온갖 표정을 애써 감추지 않고 꺼내 보여도 혼이 나거나 책잡히지 않을 수 있는 상대도 결국은 서로뿐이었다. 애석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참 귀하게도.
우리는 무던한 계절을 쌓았다. 대단히 웃겼던 일도, 그다지 좋았던 적도 없이 그저 다투고, 잠자고, 도망가고, 실수하고, 오해하고, 이해하면서 단 한 톨 정답지 않고도 정이 들었다. 어쩌면 나의 또 다른 모습만 같은 타인, 그래서 매사 못마땅하고 그래서 끝내 애처로운 사이가 가족이라면 나는 출가를 하고서도 기어이 새 가족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수였을까. 조금은 그렇다. 애석하게도. 하지만 그보다는 다행이었다고, 참 귀했다고 말하고 싶다.
강원을 졸업한 뒤로 우리는 각자의 장소에 머물렀다. 뜸하게 연락했고 드문드문 보았다. 그래도 여전했다.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함께였던 것이다. 재작년에 선원에서 다시 그를 만났을 때는 그도 나도 어엿한 비구라 할 수 있었지만 점잖은 선객이라기에는 역시 철모르는 학인에 불과한 서로의 눈빛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었다. 방선 시간이면 길들지 않은 어린 고양이들처럼 오로지 김밥집에 가기 위해 몰래 선방 쪽문을 넘나들던 겨울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그는 김밥을 사양했다. 방문은 종종 잠겨있었다. 고민이 많아 보이는 날이 길었다. 언젠가 여름이 지나면 선방 다니는 일을 당분간 멈추고 바다 건너로 오랜 도보 여행을 떠나겠다던 그에게, 꼭 방문 걸어 닫듯 자기 생각 속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다면 지구 몇 바퀴를 걸어서 돈들 제자리 아니겠냐고 시큰둥하게 나는 말했다. 그는 묵묵히 복숭아를 깎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었다. 몹시도 화를 냈었다.
그 여름의 마지막 날, 해제 법요식에 들어가기 전 나는 잠시 그의 방에 들렀다. 말끔히 짐을 비워둔 방. 덩그러니 드러누운 그의 옆으로 나도 따라 누웠다. 보란 듯이 내가 코를 후비적거려도 그는 별로 질색하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그가 마음에 들어 하던 비누 한 덩이를 꺼내어 그의 배 위에 툭 던져놓고는 방을 나왔다. 향기.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수개월이 지나고, 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답지 않게 구구절절 긴 문자 속에 다시 절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말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얼굴 한번 보자는 약속은 번복될 것이다. 나는 생각보다 담담했지만, 생각만큼 좋은 말을 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

지난 겨우내 걸었던 숲이 이번 여름에는 전혀 다른 장소로 느껴진다. 이정표가 되기도 하던 낯익은 바위들은 이끼에 싸여 그 색을 달리하고, 등성이마다 풍성하던 가랑잎 더미는 더운철 습기에 납작 가라앉아 새로운 지형을 드러내었다. 마른 골짜기로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다. 특히 초목의 기세가 놀랍다. 웃자란 풀들이 길 폭을 좁혀오고, 나무들은 가지마다 우렁우렁 이파리를 뻗쳐 사방을 덮어간다. 나는 경로를 호언장담하다가도 막상 변수를 맞닥뜨리자 어느덧 두리번거리게 되었다. 맥없이 헤매다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변화를 변수라 할 수 있을까. 여름에 여름이 와서 숲이 여름을 머금은 것을. 만남과 헤어짐을. 한 시절의 종료와 또 한 시절의 도래를. 그가 돌연 그의 길을 바꾸고 나는 다만 나의 길에 남은 것을. 변화는 변수가 아니다. 그냥, 그럴 따름이다.
알면서도 좌복 위에서 줄곧 길을 잃는다. 들이키고 내쉬는 숨에 기억이 수풀처럼 무성할 때, 예기치 않은 추억이 인동덩굴 향기처럼 삽시간에 번져올 때 좌복 위의 계절이 여름인가 한다. 수풀의 영역 안에서, 후덥지근한 향기의 반경 안에서 갈피를 놓친 채 하염없이 머무는 마음을 별수 없는 날들이 지속된다. 지겹고도 아늑한, 아득한 날들.
그러나 어느 맑은 날이면 찬물에 얼굴을 씻고, 앞서 길을 놓쳤던 지점에 나는 다시 더듬더듬 가보게 된다. 숲으로, 그리고 좌복 위로. 가쁜 호흡을 가만히 고른다. 준비한다. 두리번거리는 대신 살피기로 한다. 새삼 울창한 가운데 가늘게 뻗어있는 길이 드러난다. 거기 좁고 또 가려져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잠식되지 않은 한 줄기. 그러면 양옆에 우거진 그리움을, 흐드러진 마음들을 헤치며 나는 앞으로. 앞으로. 지나가는 여름을 지나간다.





